
폐업? 3개월마다 가게를 바꾸는 브랜드
‘반짝’하고 사라지는 가게들.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의 냉정한 현실이다. 수억 원을 들인 인테리어도, 야심 차게 개발한 메뉴도 6개월이면 소비자에게 잊힌다. 어떻게 하면 고객이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다시 찾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절박한 질문에 일본 도쿄의 한 레스토랑이 파격적인 해답을 제시했다. 바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방식이다.
일본 도쿄, ‘계절마다 다시 태어나는’ 레스토랑의 탄생

2025년 7월, 일본의 트렌드 중심지인 도쿄 아오야마에 'HAUTE COUTURE BRUNCH(오트 쿠튀르 브런치)'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이 문을 연다. ‘고급 맞춤 의상’이라는 이름처럼, 이 레스토랑의 핵심 콘셉트는 “계절을 재단해 공간을 입힌다”는 것이다.
.jpg)
가장 큰 특징은 3개월마다, 즉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게 전체를 송두리째 바꾼다는 점이다. 내부 장식, 조명, 식기, 메뉴판, 심지어 직원 유니폼까지 완전히 새로운 테마로 교체된다. 2025년 여름 그랜드 오픈의 첫 테마는 ‘라벤더 정원’. 매장 전체가 보라색과 아이스 블루 톤의 환상적인 공간으로 꾸며진다. 가을이 되면 이 공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콘셉트의 레스토랑으로 재탄생한다.
변화 속에서도 ‘핵심’은 지킨다
이들이 파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공간 전체를 맛보는 경험’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되는 올데이 다이닝(All-day Dining) 형태로, 주변 직장인부터 특별한 날을 기념하려는 연인까지 폭넓은 고객층을 겨냥한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는 것이다. 간장을 살짝 가미해 감칠맛을 내고 레몬 제스트로 상큼함을 더한 ‘단짠’ 수플레 팬케이크가 바로 그것이다. 끊임없는 변화가 주는 새로움과, 언제 가도 맛볼 수 있는 대표 메뉴가 주는 안정감. 이 두 가지를 영리하게 결합한 전략이다.
낯설지 않은 성공 공식, 한국의 ‘몽중식’
이러한 ‘체계적 변신’ 전략은 사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마치 한국의 ‘몽중식(夢中食)’을 떠올리게 한다.
.jpg)
몽중식은 약 두 달에 한 번씩 테마가 되는 ‘영화’를 바꾸고, 그 영화의 스토리에 맞춰 중식 코스 요리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화양연화>가 테마일 때는 영화 속 호텔 방 번호 ‘2046’이 적힌 열쇠를 플레이팅에 활용하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테마에서는 영화 속 캐릭터를 형상화한 딤섬을 내놓는 식이다. ‘스토리텔러’가 각 음식이 나올 때마다 영화의 장면을 설명해주며 고객의 몰입을 극대화한다.
.jpg)
공간 경험 vs 서사 경험: 변신의 두 가지 방식
두 브랜드는 ‘지속 가능한 새로움’을 통해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SNS를 통한 자발적 홍보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정확히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한다. 하지만 그 방식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HAUTE COUTURE BRUNCH
계절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바탕으로 물리적 공간 전체를 바꾸는 ‘공간 중심’의 경험을 제공한다. 막대한 초기 비용과 유지비가 들지만, 더 넓은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다.몽중식
영화라는 구체적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요리와 이야기가 결합된 ‘서사 중심’의 경험을 판매한다. 변경 주기가 2개월로 더 짧고 역동적이며, 특정 영화의 팬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명확한 타겟팅이 강점이다.
결국 두 가게 모두 음식 맛은 기본이고, ‘다음엔 어떤 모습일까?’라는 궁금증과 기대감을 판매하는 것이다.
‘한 번의 방문’을 ‘꾸준한 방문’으로 바꾸는 힘
일본의 ‘오트 쿠튀르 브런치’와 한국의 ‘몽중식’ 사례는 포화 상태인 국내 자영업 시장에 중요한 교훈을 던진다. 단순히 ‘맛’이나 ‘인테리어’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 이제는 ‘경험의 설계’가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른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이 사례에서 얻어야 할 통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방문 장치’를 비즈니스 모델에 내장해야 한다.
가게 전체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분기별 시그니처 메뉴 변경’, ‘월간 테마의 날 운영’, ‘지역 아티스트와의 주기적 협업 전시’ 등 작은 규모의 ‘체계적 변신’을 시도해볼 수 있다. 고객에게 다시 찾아야 할 명확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둘째, 변화 속에서도 ‘일관성의 닻’을 내려야 한다.
‘오트 쿠튀르 브런치’의 수플레 팬케이크처럼, 고객이 언제 찾아도 믿고 즐길 수 있는 핵심 메뉴나 서비스는 브랜드의 정체성이 된다. 이것이 있어야 변화가 ‘혼란’이 아닌 ‘즐거움’으로 인식된다.
셋째, 고객을 ‘자발적 홍보대사’로 만들어야 한다.
두 가게의 공통점은 고객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릴 수밖에 없는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mable)’한 요소를 끊임없이 제공한다는 점이다. 몽중식의 ‘드레스 코드’ 제안처럼,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는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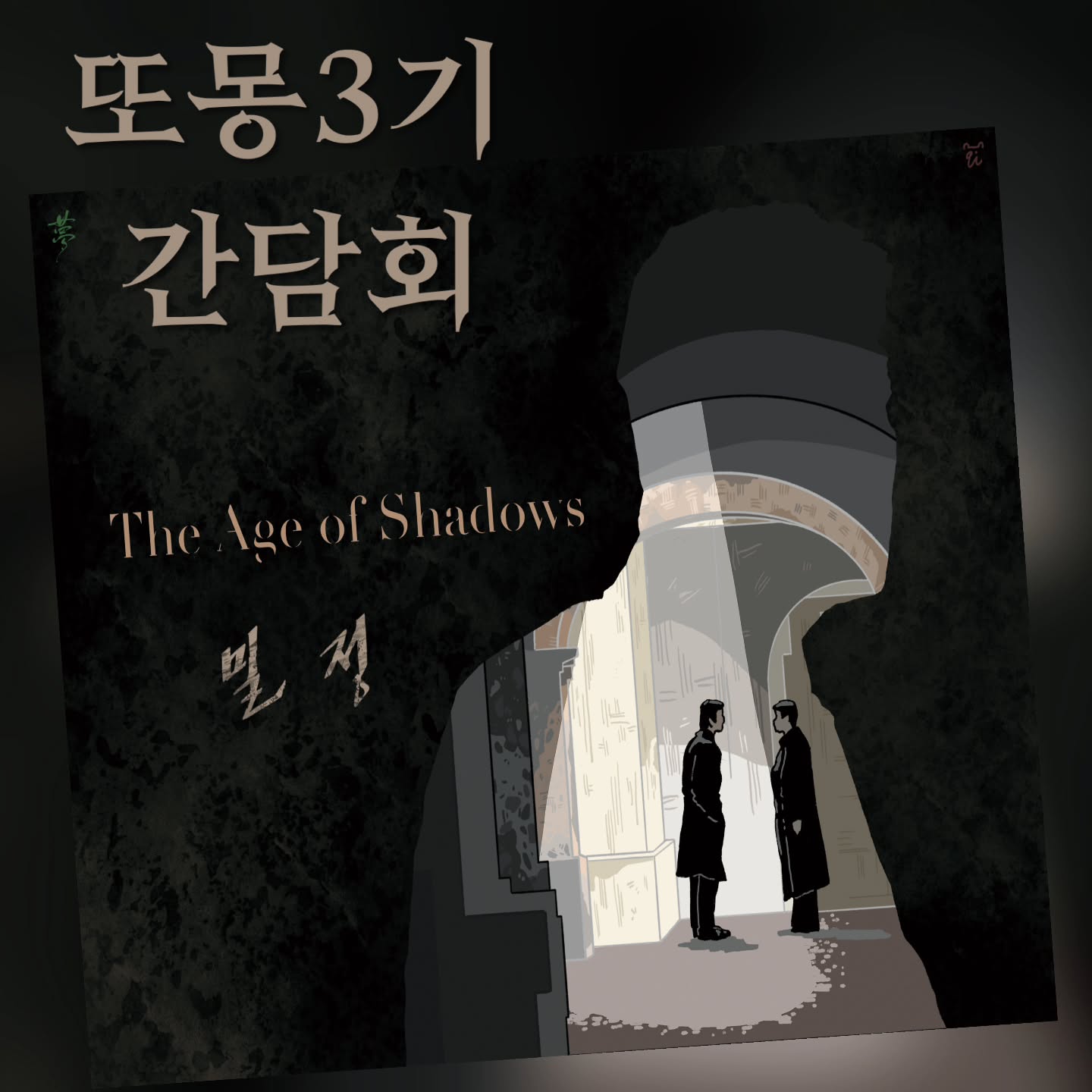
결국 이들의 성공 공식은 간단하다. 고객의 기억 속에 ‘한 번 가본 좋은 곳’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가야 할 궁금한 곳’으로 자리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가게를 살리는 ‘변신술’ 경영의 핵심이다.